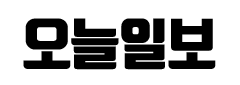- '보이는 것'이 아닌 '생각의 가치'를 사는 시대… 현대미술의 문턱을 넘다
- 캔버스를 찢은 폰타나부터 점을 찍은 이우환까지, '개념'이 권력이 되는 법
갤러리 하얀 벽면에 덩그러니 놓인 점 하나.
혹은 캔버스를 칼로 슥 그어놓은 자국.
현대미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가장 흔히 내뱉는 탄식은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나도 그리겠는' 작품들이 경매 시장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낙찰되는 현실 앞에 대중은 당혹감을 느낀다.
도대체 현대미술은 무엇을 팔기에 이토록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것일까?
■ 1. "무엇을 그렸나"가 아니라 "왜 그렸나" (철학의 승리)
과거의 미술이 사물을 얼마나 똑같이 재현하느냐(Skill)의 싸움이었다면, 카메라의 발명 이후 현대미술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Concept)의 싸움으로 변했다.
발상의 전환 : 캔버스를 칼로 찢은 루치오 폰타나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단순히 천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 2차원의 평면인 캔버스에 구멍을 내어 그 너머의 3차원 공간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이 '최초의 시도'가 가진 철학적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우환의 점 :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의 점(Point)은 단순히 찍은 점이 아니다. 돌가루를 섞은 물감이 붓에서 다할 때까지 찍어 누르는 행위, 그 시간의 흐름과 공간과의 여백을 담은 '관계'의 철학이다.
■ 2. '숙련된 노동' 대신 '예술적 권위'를 사다
현대미술 시장에서 가격은 작가의 '브랜드 파워'와 '미술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기록의 가치: "누가 먼저 이 생각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후발 주자가 아무리 똑같이, 혹은 더 정교하게 점을 찍어도 그것은 '모방'일 뿐 '창조'가 아니다.
전문가의 보증: 세계적인 큐레이터, 평론가, 유수한 미술관이 그 작가의 철학을 공인할 때, 작품은 단순한 물건에서 '인류의 문화 자산'으로 격상된다. 컬렉터들은 종이 한 장의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작가가 쌓아올린 '예술적 연대기'를 구매하는 것이다.
■ 3. 희소성과 자본의 논리
경제적 관점에서 현대미술품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한정된 공급: 거장들의 작품 수는 정해져 있다. 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자산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점 하나 찍은 그림이 수십억 원인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본가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보관된 가치: 주식이나 화폐와 달리 미술품은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미니멀리즘' 계열의 작품들은 유행을 타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세련미를 지녀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는다.
■ 결론: 당신이 보는 것은 그림인가, 생각인가?
현대미술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으로 읽는 장르다. 점 하나를 보고 "저건 나도 찍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보고 "저건 나도 조립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조립 기술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설계한 생각'이다. 이제 갤러리에서 점 하나를 마주한다면, 작가가 그 점을 찍기 위해 비워낸 고뇌의 시간과 그 점이 세상에 던지는 질문을 상상해 보라. 그때 비로소 수십억 원이라는 가격표 너머의 진짜 예술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