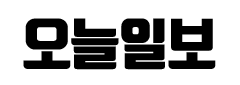- "자연을 뚫고 지나가는 거대한 비명을 '들었을' 뿐"… 화가의 일기가 말하는 진실
- 입을 벌린 것은 비명을 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견디기 위한 몸부림
해골을 연상시키는 얼굴, 양손으로 뺨을 감싸고 입을 크게 벌린 공포에 질린 표정.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의 '절규(The Scream)'는 현대인의 불안을 상징하는 아이콘과 같다.
우리는 흔히 이 그림 속 인물이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술 사학자들과 뭉크의 일기가 전하는 진실은 정반대다. 그림 속 인물은 비명을 지르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려오는 비명을 견디지 못해 귀를 막고 있는 관찰자다.
■ 1. "나는 자연을 뚫고 지나가는 무한한 비명을 느꼈다"
뭉크는 1892년 자신의 일기에 이 그림의 배경이 된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나는 멈춰 섰고,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피오르드와 도시 위로 피와 불의 혀가 뻗쳐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공포에 떨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자연을 뚫고 지나가는 거대하고 끝없는 비명을 들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 비명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였다. 그림 속 주인공은 그 압도적인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 2. 제목의 오역이 낳은 130년의 오해
이러한 오해는 제목의 번역 과정에서도 증폭됐다. 이 작품의 원래 독일어 제목은 'Der Schrei der Natur', 즉 '자연의 비명'이다.
우리의 오해: 주인공이 '절규하는(Screaming)' 모습에 집중함.
그림의 본질: 자연에서 터져 나온 비명을 '듣고 괴로워하는' 인간의 실존적 불안.
실제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주인공의 입 모양은 소리를 내뱉는 형태라기보다 공포에 질려 벌어진 상태에 가깝다. 오히려 양손은 귀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환청이나 소음을 차단하려는 본능적인 동작이다.
■ 3. 핏빛 하늘의 정체는 '화산 폭발' 때문?
뭉크가 목격한 기괴한 '핏빛 하늘'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과학적 분석이 존재한다.
1883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아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그 여파로 발생한 성층권의 화산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북유럽 오슬로에서도 유난히 붉고 공포스러운 노을이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어린 시절 가족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신경쇠약을 앓았던 뭉크에게, 이 비정상적인 대기의 변화는 '자연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공포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
■ 결론: 당신의 귀에만 들리는 '불안'의 소리
뭉크의 '절규'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괴한 외모 때문이 아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통과 불안, 즉 '마음의 비명'을 견뎌내야 하는 현대인의 고독을 완벽하게 시각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본다면, 비명 소리를 내는 입이 아니라 소리를 막으려 애쓰는 양손에 주목해 보라.
뭉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도 지금 당신을 에워싼 세상의 비명이 들리는가?"